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9월 30일 오전, 쇼가 끝나고 런웨이가 있었던 자리에 기다란 테이블을 놓고 직원들과 햄버거를 먹고 들어왔다. 내 앞에 있던 셰프는 그 자리에서 햄버거 2개를 다 먹어치웠다. 금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고, 새벽 5시 쯤에 업체에서 와서 옷이 걸려진 행거를 공항에서 캐리어를 포장하듯이 검은색 롤테이프로 행거 통째로 칭칭 감았다. 남아있던 세피스 정도는 직원들과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지고 갔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허둥지둥하지 말아야 된다는 긴장감에 피곤할 틈도 못 느꼈다. 보통은 몸의 건강이 정신에 영향을 주지만 이럴 땐 정신이 몸을 지배하기도 한다. 한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택시를 탔을 때가 되서야, 30시간 정도 일하고 곯아떨어졌음을 몸이 직감했다. 깊게 잠을 자다가 집 앞에서 내렸고 입에서 나는 햄버거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다. 술을 마시고도, 아침으로도, 햄버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샤워를 하고 밀린 잠을 잤다.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한국드라마를(이보영 배우가 나오는 대행사) 보다가 다시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다. 일요일에도 쉬었고, 월요일인 오늘은 포상휴가로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쇼장에는 이미 모델들에게 옷을 입히는 전문업체도 있고, 사진찍는 사람들, 디자인팀 등 너무 인원이 많아서 아뜰리에 파트에서 가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셰프가 막바지에 나에게도 가겠냐고 물었다. 한껏 들떠서 '좋아요ㅇ_ㅇ!!'라고 대답을 했다. 마지막 수정에 크레놀린을 너무 세게 넣어서 핏팅하고나서 디자이너가 화를내고 셰프가 디펜스를 해주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잘린건 아닌가' 싶었다. 당장 아뜰리에팀이 있던 프레스실에 가져가서 크레놀린도 빼고 뒷중심에 달린 잠금벨트도 수정 전의 위치로 옮겼다. 욜렌은 급박한 분위기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을 계속 떨었고 급기야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 한방울이 옷에 묻었다. 내가 침착하게 '캐리어에 쎄럼피지올로지 있지 않아?'라고 하니까 델핀이 더 침착하게 '괜찮아, 걱정마' 하면서 욜렌에게 건네주었다.
델핀의 원피스를 모델이 피팅하면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흘러내리려고 했고, 네명이서 달라 붙어서 수습은 했지만 측면에서는 가슴이 다 보이는 상태로 나갔다. 일주일 전부터 내가 잘못 잘라서 그날부터 이틀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수달린 보디수트가 있는데 드롭되었다가 다시 셀렉된 착장이었다. 다른 동료직원이 디벨롭한 치마와 함께 착장이 되었고 치마가 너무 커서 흘러내렸다. 욜렌과 루카를 불러서 보디수트에 치마를 고정시키고 보디수트도 안에 있던 톱에 한번 더 고정시켰다. 어느 수요일이었다. 그 자수원단을 걸쳐놨다가 무슨 생각인지 가위질을 하는데 뒤에 파인 부분까지 잘라버렸다. 반대쪽을 고정시키면서 얼굴이 하얘졌다. 여긴 자르면 안되는 부분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수백시간이 걸려 완성된 옷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었다. 처음으로 저지른 정말 멍청하고 커다란 실수였다. 게다가 이 맞춤 자수원단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저녁을 먹으라고 동료들이 불러서 갔는데도 속이 울렁거리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놓고 다시 와서 앉았다. 마음을 추스리고 셰프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했다. 셰프는 전혀 화내지도 않았고 나중에 원단을 이어서 붙이면 된다고 했다. 당연하게도 다음날 미팅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질타를 대신 받은 건 셰프였고, 능청스럽게 원래 원단이 잘려있었다고 둘러댔다는 소식만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다. 고맙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그날엔 집에 돌아와서 잠도 못자고, 다음날 오후타임 출근 전까지도 아무 것도 못하고 웅크려 있었다.
업체들이 진행하는 쇼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모델들 위치마다 옷과 악세서리, 사진들이 착착 놓여 있었고, 모델들 각각 번호가 있었으며 입장하는 위치에 간격을 맞춰서 흰색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있었다. 동선체크를 위해서 옷을 입기 전에 모델들이 한번씩 워킹을 하고, 얼굴 메이크업을 받고,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몸에도 메이크업을 더 받았다. 까탈을 부리고 옷을 안입고 있던 모델들에게 업체직원들은 아주 능숙하게 Girls~ 이제 옷입을 시간이야~ 라고 타일렀다. 41명의 모델중에서 2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내가 담당했던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명이 있어서 한국말로 아는 척을 했고 옷을 입는 것도 도와줬다. 내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는 찰나에 그녀가 와서 내 팔목을 잡더니 발등에 붙일 투명한 밴드를 달라고 부탁했다. 누군가가 팔목을 잡는 것도 오랜만이다. 프랑스에서는 인사치례로 비주를 하기는 하지만 손을 잡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녀의 발등에 붙여있던 익숙한 메디폼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더러워진 메디폼을 떼어내고 밴드를 새로 붙여줬다. 드디어 모델들이 나가고 델핀과 메이크업실에 가서 커다란 텔레비젼 앞에 앉아서 런웨이를 지켜봤다. 마지막에 단체로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복도로 돌아왔고 델핀은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셰프도 우리를 다 하나씩 꼭 안아줬고 나도 그때는 눈물이 살짝 났다. 델핀이 자기 원피스 때문에 잘리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잘려도 내가 먼저 잘릴 것이라며 받아쳤다. 비록 팀에 조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맡은 일은 별로 없었지만 백스테이지에서 이 긴박한 순간을 경험한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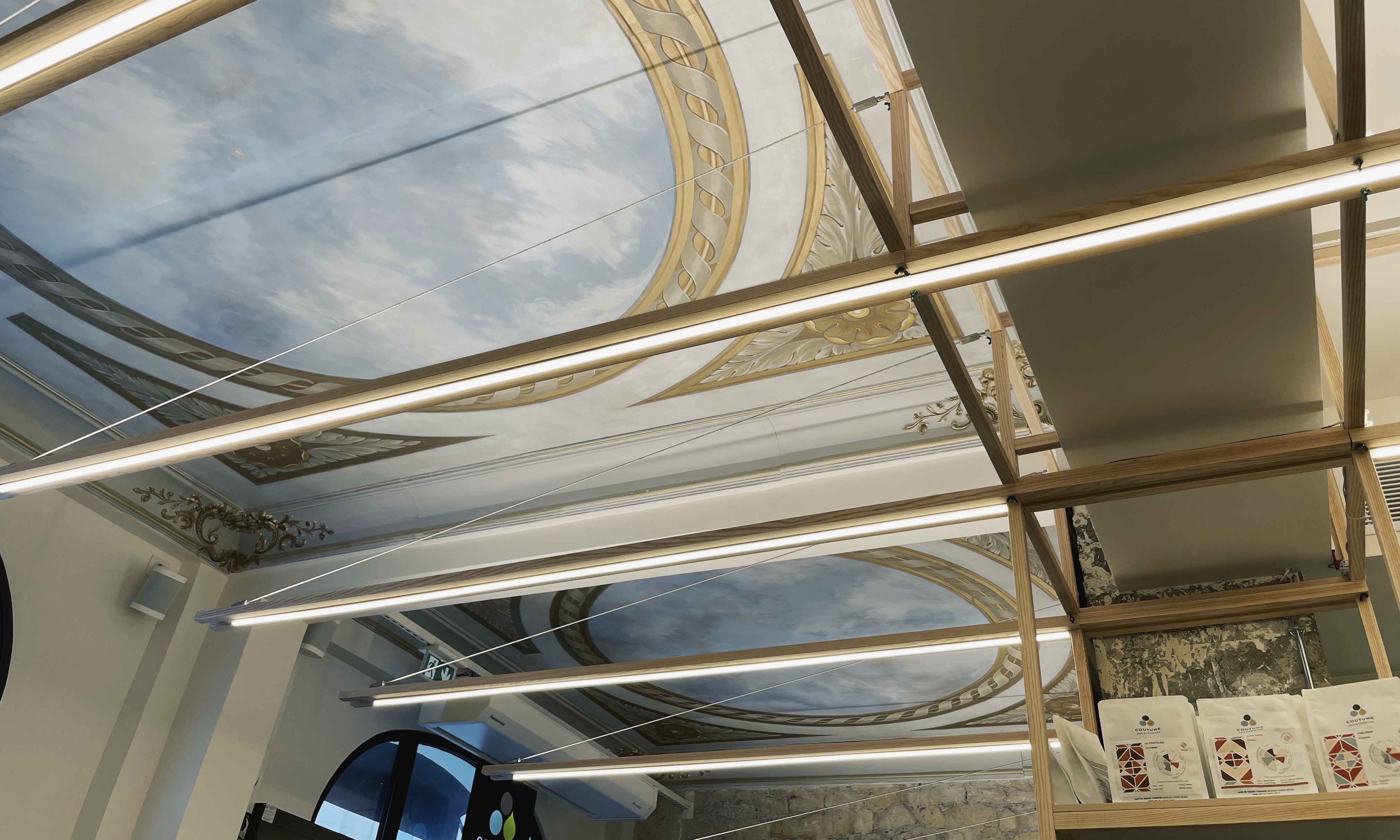


















'甛蜜蜜 > 꿈에 카메라를 가져올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ast lives (2) | 2023.11.01 |
|---|---|
| 라꾸노치 (4) | 2023.10.22 |
| L'ARCALOD (0) | 2023.09.17 |
| 알차고 슬기롭게 (0) | 2023.07.19 |
| The MET (0) | 2023.06.30 |





댓글 영역